반응형
담임 선생님과의 약속은 오전 11시, 나는 10시 30분부터 차가웠던, 몸 보다 마음이 훨씬 더 추웠던 교실 안에서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젯밤부터 준비했던 말들을 처음부터 다시 연습해보면서 하도 많이 봐서 너덜너덜해진 종이 쪽지 한 장을 쥐고 있었다. 12월의 교실 안에는 나 말고도 몇 명의 친구들이 군데군데 떨어져 앉아서 자신의 점수로 안전하게, 혹은 아슬아슬하게라도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대학들을 표시하고 있다. 색색깔 형광펜이 요란하게 그어진 대학별 전형표. 내가 조금 전까지 뚫어져라 보고 있던 것도 바로 그 전형표이다.
드디어 약속했던 11시가 되었고 담임 선생님이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모습이 보였다. 선생님과 상담을 한 후에 최종적으로 대학 입시 원서를 쓰기로 했던 것이었다. 과연 어떤 대학에 원서를 넣게 될까, 잦아들었던 심박동수가 다시 빨라지기 시작했고 나는 속으로 다시한번 어젯밤에 미리 점찍어 두었던 대학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되새겨보았다.
그런데 내 쪽으로 걸어오는 줄 알았던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방향을 홱 트시더니 다른 친구 쪽으로 가시는 것이 아닌가? 11시는 내 시간인데...... . 선생님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시고는 그 친구의 원서가 좀 급하니 나에게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하셨다. 수능 점수가 형편 없는, 이른바 우등생이 아니었던 나는 사실 다른 친구들 앞에서 선생님하고 대학 진학 상담을 하기도 부끄러웠던지라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다.
사실 더 볼 것도 없었지만 나는 다시한번 대학 전형표를 보는 척 하면서 귀는 그 친구와 선생님께로 활짝 열어 놓은 채,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한 시간 쯤 기다리니 선생님이 미안하다고 하시며 내 앞으로 오신다. 나는 또 떨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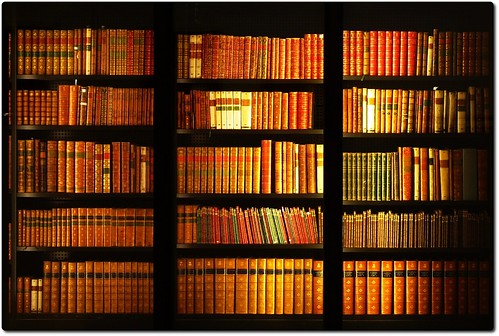
| Iqra: Read by Swamibu |
그래, 어느 대학에 가고 싶니? 과는?
공부 못하는게 죄는 아니었을텐데, 왜 그리 움츠려졌는지 잔뜩 주눅이 들어서는 더듬거리며 대학명을 하나씩 이야기 했다. 과는 국문과로요. 전부 다 국문과로 쓰고 싶어요.
그래? 안전하게 A대학에는 꼭 써야 된다. 국문과도 괜찮겠다. A대학에는 꼭 써야 돼. 알았지? 네?......아, 네. 그리곤 끝이었다. 내 형편없는 수능 점수로는 입시 전략을 짜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는 듯, 선생님은 A대학만을 강조하시곤 가셨고 나는 참 부끄러웠다. 성적 좋은 친구와 한 시간 동안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시던 선생님의 모습을 내 초라한 성적표 앞에서는 볼 수 없음이 참 비참하게 느껴졌던 순간이었다. 십 년도 더 된 일이다.
학창시절 나는 공부를 잘 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잘 놀지도 못했으니 선생님의 눈에 잘 띌 리 없는 '병풍' 중 하나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랬을까? 나는 학교 가는 일이 참 재미가 없었고 매일 아침 피곤했으며 성적도 나쁘면서 시험 기간마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 나만 그랬을까?? 내 생각으로는 성적이 부진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우울한 학창시절을 보냈을 것 같다. 나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대우받는 더러운(?) 학교, 이 치사한 굴레에서 얼른 벗어나리라 결심을 했었다.
그런데 꼴찌도 행복한 교실이 독일에는 있단다. 아니, 그 곳은 아예 자신이 꼴찌인지 일등인지 알지 못하는 천국과도 같은 곳이란다. 시험 스트레스 때문에 학생들이 힘들까봐 시험 일정을 미리 이야기하지 않는 믿을 수 없는 곳이 바로 그 곳이란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의아해 하는 나에게 블로그 '독일 교육 이야기'를 운영하는 박성숙(무터킨더) 님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천천히 말씀해주신다.
지금처럼 성적에 목숨 걸지 않아도 예쁜 우리 아이들을 삭막한 경쟁 속으로 내몰지 않아도 밤 열시가 넘도록 학원을 전전하지 않아도 꿈꿀 수 있는 행복한 세상이 있다('꼴찌도 행복한 교실' 머리말 중. 21세기 북스 박성숙 저)고 말이다.

지난 주에 저자 박성숙 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독일 교육 이야기가 궁금해서 '꼴찌도 행복한 교실' 책 간담회에 다녀왔다. 간담회에서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독일 학교의 얘기를 듣고는(박성숙 씨는 현재 독일에서 거주하면서 초등학교와 김나지움에 다니고 있는 두 아이를 기르고 있는 엄마이자 블로그 '독일 교육 이야기'를 운영하고 있는 블로거이다.) 내내 갸우뚱했다.
달라도 너무 다르기에 내가 직접 겪어보지 않고는 믿기도 이해하기도 힘든 학교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실정은 초등학교 때부터 밤 늦도록 이 학원 저 학원으로 뺑뺑이 도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독일에는 낙제생이 아니면 학원에 다니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하고, 우리나라는 중학생만 돼도 잠이 부족해서 다크서클이 무릎까지 내려올 지경인데, 독일에서는 놀면서 운동하면서 공부해도 부족하지 않기에 8시면 아이들이 잠자리에 든다고 한다.
대신 어릴 때부터 문제 해결 학습과 실습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조를 짜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수업을 이끌어 가고, 아이디어를 짜내어 결과물도 만들어 낸단다. 실 예를 들어보니 우리가 대학에 가서야 하게 될 과제들을 독일 학생들은 초등학교때부터 하고 있었다. 일류대라는 개념도 없으니 꼭 대학에 가지 않아도 그만이고 자신이 원한다면 우리나라로 치면 고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바로 일터로 뛰어들 수도 있단다.
삶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독일 내 분위기 덕에 자신이 꿈꾸는 삶의 방식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독일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쟁이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 다르게 인식되고 있단다.
 Skipping Schoolgirls outside Victoria Station, London by UGArdener |
대부분의 학생들이 치열하게 공부하지 않고 학교에서도 배워야 할 기본 교육과정을 느슨하게 마련해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가 되지는 않을지 궁금해지기도 했다. 내가 우리나라 교육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 다 소화할 수도 없으면서 우리나라처럼 꼭 그렇게 많은 것들쏟아 부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공부해야 할 시기에 바짝 집중해서 하면 좋을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 . 독일과 우리나라의 딱 중간이면 좋을텐데...... .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경쟁보다는 협동을 강조하는 독일의 학교에는 스트레스가 없다는 것이다. 내가 학교를 다니던 20년(!!) 동안 시험 기간만 되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무척 힘들었던 것과는 달리 독일의 학생들은 매일 신나고 재미있게 등교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반응형
'리뷰 이야기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산화탄소 배출이 제로인 집, 내가 살고 싶은 에코하우스 (0) | 2010.05.06 |
|---|---|
| 와이프로거를 위한 포토샵 강좌를 듣고 왔어요. (0) | 2010.04.22 |
| 벤처 소비자 서포터즈 3차 품평회에 다녀왔다. (0) | 2009.07.03 |